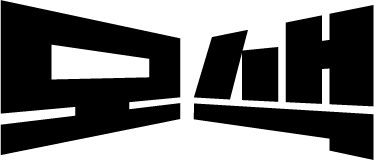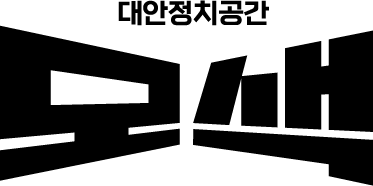『녹색당의 실험과 가능성의 기록: 2010년대 새로운 정당 운동의 유산화』를 연재합니다. 본 연재는 2024년 10월 제주에서 ‘다른 정치의 본령'(이하 다정본) 주최로 열린 워크숍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며, ‘대안정치공간 모색’이 공동 편집하였습니다. 다정본은 녹색당, 정의당 등 정당 활동 경험이 있는 연구자와 활동가가 모여 정당과 정치조직화에 관해 탐구하는 모임입니다.
※ 글에 관한 의견 및 토론은 댓글 또는 teammosaek@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문 게재를 요청하시는 경우 검토 및 편집을 거쳐 게재할 수 있습니다.
3부. 내가 만난 녹색당
녹색당에 대한 회고 그리고 질문
김은주
서울에서 녹색당원이 되어 지금은 제주에서 살고있다.
첫 만남
녹색당을 처음 알게된 건 순전히 우연이었다. 대학 시절 인턴활동을 했던 단체가 함께 사무실을 이용하던 곳이 녹색당 창당을 준비하던 ‘초록별 사람들’이라는 곳이었다. 개인적으로는 해당 인턴 활동을 하면서 YMCA 밖의 시민단체의 활동가들을 접할 수 있었고 거기서 만난 여성들이 이색적이면서도 멋져보였다. 어떤 행사 뒷풀이 때 발기인에 서명 제안을 받았고 시민단체 후원가입 정도로, 별 생각없이 가입했던 기억이 난다.
기존의 정당 정치가 어렵게 느껴지고 시민단체 활동이 더 친숙했던, 대안적인 삶을 지향하던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 녹색당은 새로운 구심점이 되었던 것 같다. 반정당의 정당, 떡갈나무 혁명 같은 캐치프레이즈들이 기존의 정당, 정치와는 다른 신선함을 주었다.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녹색당에 가입을 했고 새로운 조직에 대한 기대, 열망 같은 것들이 꽤나 고무적이었다. 녹색당원을 만나는게 반가운 일이었다. 우연이었지만 일찍이 당원으로 가입을 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낄 정도로 꽤나 당을 좋아했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해보면 녹색당은 내게 ‘정당’보다는 문화적 취향 공동체 같은 말랑말랑한 느낌이었고 그것이 내가 생각한 ‘녹색당스러움’이었던 것 같다. 물론 각자의 ‘녹색당스러움’을 맞추어 가는데 10년 이상이 걸렸고 어쩌면 지금도 정리되지 않았고, 이것이 정리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정리해가는 것이 정당인 걸까 등등 많은 질문이 떠오른다.
녹색당의 효용감
사실 나는 지역당 활동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 당원 가입 초기에 서울에서 같이 살던 친구들과 지역당원 모임에 갔을 때엔 이미 그 지역의 공동체 마을 사람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고, 이성애 기혼자 중심의 모임 구성에 실망하고 모임을 찾지 않았다. 서울에서의 녹색당 활동은 지역당 활동을 하지 않아도 충분한 느낌이었다. 굳이 지역 모임을 하지 않아도 서울에 살면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이슈들에 녹색당은 내가 리트윗 할 수 있는 논평들을 내주었고, 필요하면 집회에 가서 당 깃발아래 서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했기 때문이다.
보통 위기의 순간에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데, 시작의 기세가 좋아서였는지 초반에는 위기에서 기인한 정체성 논의는 많지 않았던 것 같다. 청소년 당원들을 대하는 언어 사용이나(‘미래의 우리 아이들을 위해 탈핵하자’는 현수막 문구들이 청소년을 동료 시민이 아닌 보호해야할 대상으로 대상화 한다는 문제제기) 당내 모임에서의 육식, 동물권 이슈(치맥 뒷풀이 사진 등을 페이스북에 업로드 하는 행위나 라쿤털-이라고 추정되는-이 부착된 옷을 부각시킨 사진을 당직자가 온라인에 업로드 했다던지) 등 일상 속에서 촉발된 당내 갈등들이 있었지만 단일하다고 생각했던 녹색당 구성원들 사이의 차이를 드러내는 유의미한 시간과 토론이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도 그런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관점들을 새롭게 학습할 수 있었고, 시민으로서 정치 학습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발견했으며, 이것이 내가 느낀 녹색당의 효용감이었다.
페미니즘
지역당을 뒤로하고 그나마 관심을 가졌던 모임이 페미니즘 모임이었다. 나름 야심차게 시작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모임 후기가 페이스북에 올라가자 ‘꽃 같은 분들이 모였다’는 댓글이 달려서 ‘내가 생각했던 것 보다 녹색당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여기도 갈길이 멀구나’하는 생각을 했었다. 모임이 영글기도 전에 남성 당원에게도 모임을 여네 마네 하는 논쟁으로 피곤해져서 모임에는 나가지 않았던 것 같다. 녹색당 안에서도 페미니즘을 설득하고 쟁취해야 한다는 생각에 피로감을 느낀 것이다. 내가 생각한 ‘녹색당스러움’에는 당원 모두가 페미니즘을 지지하고 실천할 것이라는 다소 순진한/얄팍한 기대가 있던 것이다. 그렇다고 스스로 당내에서 페미니스트들을 조직하거나 세력화할 의지까지는 갖지 못했다.
당내에서 페미니즘의 움직임은 분명히 어떤 긴장을 만들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 녹색당은 ‘페미니스트 서울시장 후보’를 내는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정당이 되어있었다. 이것이 단순히 페미니즘 리부트의 물결이 녹색당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일까? 아니면 평등문화약속문이나 여성과반제 등 녹색당의 ‘성평등적 실천’이 당원들을 ‘페미니스트’로 성장시킨 덕일까? 이 과정에서 어떤 실천들이 있었고 어떤 긴장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생태적 실천도, 페미니즘도 함께 추구하는 당을 원했고 그렇기에 녹색당이 페미니즘 정당이기를 원했다. 페미니즘 정당으로서의 녹색당이 한 후보 개인의 페미니스트라는 선언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페미니스트 당원들의 바람과 실천으로 주요한 당의 입장이 된 것은 아니었을까?
녹색당의 아이러니함
2018 서울시장 선거를 거치면서, 페미니스트 후보라는 전략이 녹색당 밖의 대중에게도 호응을 불러일으키면서 페미니즘은 녹색당의 주요 어젠다로 완전히 자리잡게 된다. 정당은 시민단체와 달리 선거를 치르니까, 어떤 전략이 선거에서 당 밖의 대중에게 호응을 얻으면 그것이 당 내부에서도 우위를 점하게 된다. 그런데 녹색당이 기세 좋게 시작해서 세를 늘려가는데 주요했던 것은 생태, 페미니즘, 동물권, 대안정치 등 기존 정치권 변두리에 있던 어젠다들을 선진적으로 외쳤기 때문이다. 정치 조직화 되지 않았던 어떤 부류들의 구심점으로 초기 조직화가 이루어졌고, 나는 그러한 어젠다를 정치화 했다는 점은 높이 사고 싶다. 자부심을 가질 필요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우리가 외치던 구호가 이미 실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더 급진적이고 선명한, 차별화된 어젠다를 내지 못하자 당 자체의 구심력이 약해진 것 아닐까? 그렇다면 녹색당은 항상 더 급진적이고 선명한 차별성을 보여야 하는 것일까? ‘대중의 선택’을 받는 것이 선거라면, 언제 녹색당은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나는 왜 계속 당적을 유지하는가?
기세는 수그러든지 오래고 맨날 싸우기만 하는 것 같은 당의 당적을 나는 왜 계속 유지하고 있을까? 녹색당이 내걸었던 생태적 가치가 나의 정치적 노선이었고, 우연이었다 하더라도 내가 선택했고, 많은 사람들이 버티고 지키고 있는데, 빚지는 마음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정치적으로 시민으로서 학습해갈 수 있는 곳이 정당이라면, 그 정도의 기능은 그래도 아직 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일까? 지난 10여년간 맨 땅에서 당이 쌓아온 노하우와 네트워크들이 아직은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일까? 단추를 잘못 꿰었다면 단추를 풀어서 다시 맞추어야 할까 아니면 자꾸만 잘못 꿰어지는 단추를 갈아버려야 할까?